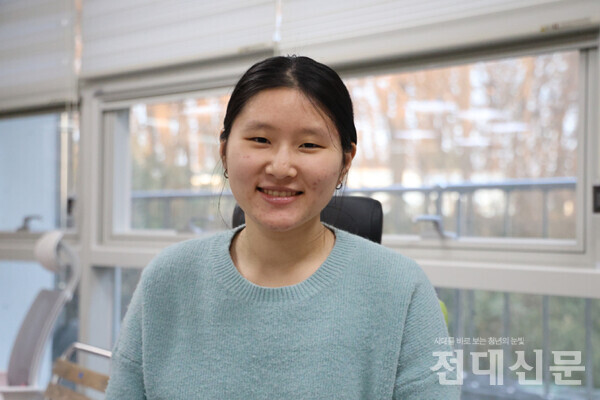
2025년은 변화의 해다. 대학도, 사회도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.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4년째 바라보는 <전대신문>의 익숙한 풍경일 것이다. 역대 많은 편집국장들도 그랬겠지만, 나 역시 처음부터 편집국장이 되고자 했던 건 아니었다.
<전대신문>에서 1년을 보냈을 땐 '2년은 채워야 어디 가서 활동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'라는 생각이었다. 2년을 보냈을 땐 '지금 이 사람들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'는 마음이었다. 그리고 3년을 보낼 때에는 기사를 쓰는 과정이 힘들더라도, 완성된 신문을 볼 때마다 성취감을 느꼈다. 그것이 마치 중독처럼 계속 나를 이끌었다.
하지만 어느 순간 이 신문사의 풍경이 지겹게 느껴졌다. 똑같은 자리, 똑같은 명패, 똑같은 루틴.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'이제 떠날 때다!'라는 확신이 들었던 건 <전대신문> 1667호를 만들 때였던 것 같다. 어떤 특별한 일이 있던 것은 아니다. 항상 와서 기사를 쓰던 내 지정 자리를 바라보며 낯선 감각이 스쳤고, 이 어질러진 공간을 빨리 정리하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.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다.
그렇기에 처음 몇 번은 국장 제안을 거절했었다. 또 똑같은 일을 하기 싫었기 때문이다. 그러나 거듭되는 설득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. 자기 전에는 국장직을 맡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자고 일어나면 국장직을 맡기 싫어 오늘은 꼭 제대로 거절 의사를 밝히겠다고 다짐을 했다. 이틀 내내 결심이 뒤집히는 아침과 저녁을 번갈아가며 스마트폰 메모장에 ‘국장이 되면 좋은 점’과 ‘국장이 되면 싫은 점’을 적었다. 지금까지 인생에서 이리 오래 고민한 적은 또 처음이었다.
그런 나에게 누군가가 말했다. "국장은 일반 정기자나 팀장과는 완전히 다르다. 국장이 되어 보는 <전대신문>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일 것이다." 또 다른 누군가는 말했다. "<전대신문>을 4년째하는 기자가 만드는 농익은 신문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른다. 숲과 나무 모두를 볼 수 있을 것이다" 마음에 꽂혔던 이 말들이 결국 내 결심을 흔들었다.
냉철하게 내 인생 진로를 그리며 맡은 자리는 아니다. 그저 새로운 신문을 만들고 싶었다. 이대로 떠나기에 나는 너무나 다음 신문을 기대하고 있었다.

